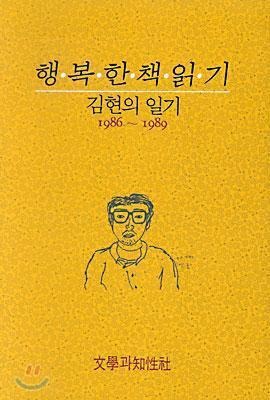티스토리 뷰
<버선발 이야기> 백기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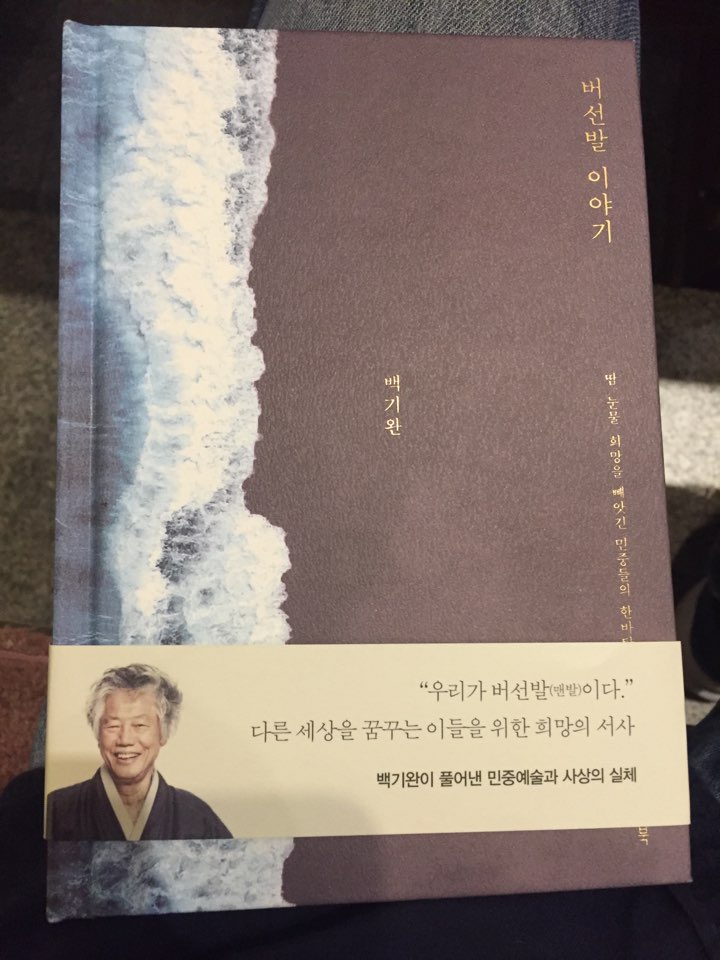
지난 4월 2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백기완선생님은 이 시대의 큰 어른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 그리고 니나(민중)의 예술과 넋살(정신)을 참 우리말로 풀어 이야기하시는 분 입니다.

선생님은 내게 87년 대선때 독자 민중후보로 추대되었으나, 야권(김대중, 김영삼) 대선후보단일화를 호소하며 중도 사퇴를 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김 단일화의 실패로 결과적으로 1/3의 득표율 만으로 군사정권의 노태우가 어부지리 대통령 당선이 되었었죠. 그리고 내가 대학생때인 - 휴학후 군 복무 시절 - 92년 대선, 다시 재야에서 독자 민중후보로 추대되어 완주를 하게 되나, 3당 야합의 민자당 후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으로 어렵게 되찾은 87년 민주화의 봄이 정치권력간의 반목과 야합때문에 그 꽃이 피기 까지는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선발 이야기>는 니나(민중)인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나 외래어가 하나도 없는 우리 겨레말로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백기완선생님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 스승인 사상계의 장준하선생과 같이 고초를 치를때도 장준하선생이 '백기완은 아무리 고문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일 죽게 되면 우리 민중의 말과 문화도 같이 죽는 것이니 그만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준하선생은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대대로 머슴의 삶을 모질게 살아온 버선발의 바위위 집은 전형적인 니나(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성도 없고 변변한 이름도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름 '버선발'에서 알 수 있듯이 '노다지(늘) 발을 벗고 살다 보니' 그리 불린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남의 집 머슴을 사는 엄마가 마치 새끼줄에 목이 매인 망아지처럼 새벽부터 일터엘 나가시게 되면 집구석이라는 게 버선발의 그 알량한 밥이나마 차려놓을 만한 데가 없었다.'(13쪽)
새벽같이 머슴 일을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홀어머니를 기다리며 건건이(반찬)도 없이 깡조밥을 홀로 먹다 목에 걸려 죽다 살아난 다섯살 버선발은 냇물을 따라 가다 길에서 같은 처지의 동무들을 만나 바다를 생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팥배와 개암이와의 짧았던 우정은 머슴살이를 피해 야반도주한 팥배네 이야기를 새끼줄에 목이 매여 머슴살이 가는 개암이에게서 듣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머슴살이가 무엇인지 몰라 엄마에게 버선발은 자꾸 머슴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는데, 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토해내며 버선발을 꼭 껴안고 맙니다. 버선발도 그런 엄마의 몸서리임의 느낌으로 어린 마음에도 이해를 합니다.
'얘야 버선발아, 머슴이란 말이다, 그건 딴 게 아니란다. 바로 내가, 네 애미가 머슴이다. 네가 보고 싶어 대뜸 달려오고 싶어도 끝내 달려오질 못하는 네 애비, 네 애미의 그 피눈물이 바로 머슴이라니까.' (56~57쪽)
엄마는 버선발에게 머슴살이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고 한겨울 버선발을 도망시키고 결국 알범(주인)의 개마름(앞잡이)들에게 다부지게 일갈을 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버선발은 먼발치서 그 참상을 보다 넋살(정신)을 잃고 있다 엄마의 참뜻을 알고 텀줄기(산줄기)속으로 들어가 텀속(산속)에서 사냥꾼들을 만나 같이 살게 됩니다. 버선발은 처음으로 그들에게서 '내거'아닌 '우리'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인석아, 이건 알로(사실)는 우리 아들놈을 주려고 해놓았던 염소가죽 바지저고리다. 하지만 이 텀골, 텀을 사는 사람들에게 앞뒤라는 게 있는 줄 아느냐, 없다구, 쭐이 타는(다급한) 놈부터 먼저 입고 보는 거다, 알가서?"(81쪽)
행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버선발이 열 한살 무렵 마들(장마당)에 나갔다 붙잡혀 또래 아이들과 텀자락(산자락)의 돌과 흙을 파서 늪에다 붓고 또 붓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역시 노역하다 다리에 부상을 당해 늪속에 버려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 그러나 두 다리는 사라진 - 어릴적 벗 개암이를 만납니다. 개암이를 들쳐 업고 도망쳐 다시 길을 떠난 버선발은 벗을 살리고자 이곳저곳 비럭질을 다니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겉도 따뜻하고 속은 더욱 넉넉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솥을 준 할아버지, 떡을 한 조박(조각) 집어주고 김칫국 한 바가지를 준 아주머니, 갈아입을 새옷을 준 할아버지 등. 그리고 버선발은 이 굿판에서 배워본 적도 없는 춤을 무엇엔가 이끌려 한판 신명나게 춥니다. 이 춤을 보고 사람들은 '주어진 판은 깨고 우리 무지랭이 니나(민중)들의 판을 한사위로 일군다는, 아, 그 한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암이를 다시 빼앗기고, 여러 짠(천)도 더 되는 사람들이 땅 때문에 처참히 죽어가는 광경을 본 버선발은 '그 눈물 젖은 설운내, 아니 그 안타까운 끓탄(비극)에' 아주 회까닥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내말 좀 들어보소. 오는 세 달(삼월) 첫하룻날(초하룻날) 새벽에, 애든 어른이든 아니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어쨌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작대기 하나씩만 들고 바닷가로 나와 한 줄로 서시오. 그리하면 곧 그 바다를 없애 몽땅 땅을 만들 터이니 그 누구든 제 마음껏 달려가 그 작대기를 꽂기만 하면 거기를 제 땅이라고 쳐주겠나이다." (148쪽)
그러나 사람들이 버선발의 선의를 고마워 하기 보다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 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사갈(죄)를 저질렀다고 탄식하며 바다 한 가운데 외딴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거란 곧 거짓이요, 거짓은 썩물(썩음, 부패)이요, 그리하여 그것은 곧 막심(폭력)이요, 따라서 그 막심은 바로 사갈(죄)이라 할 수가 있다네."(188쪽)
"(다 같이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거) 노나메기란 우리 사람의 참짜 꿈인 바랄이요, 온이(인류)의 하제(희망)라네."(212쪽)
캄캄한 수챗구멍에서 마침내 다시 만난 어머니의 이슬에 젖은 불, 젖은 눈을 보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참짜 벗나래(세상)을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햇살 고운 언덕에 고이 모십니다. 톡배 놈을 딱 한 방 발구르기로 없애버리고 서울로 향한 버선발은 높은 잿집(기와집)의 납쇠(돈놀이꾼), 쫄망쇠(투기꾼), 뼉쇠(인신매매) 같은 악인을 징벌합니다. 이제 버선발은 흐르는 핏줄기 속에서 뜬쇠(새뚝이;예술가), 나간이(장애인), 그리고 이름모를 니나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맨 뒤에서 온몸이 핏덩어리라 썅이로구 누구인지를 도통 알아볼 수가 없게시리 눈만 반짝반짝하는 한 아저씨가 다리 부러진 지게를 한쪽 어깨에다 비스듬히 걸친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펑펑 울면서 따라가더라는 이야기다.'(272쪽)
버선발이 바로 백기완선생님 당신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우리 니나(민중)의 이야기 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니나들에게 오래도록 참 가르침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