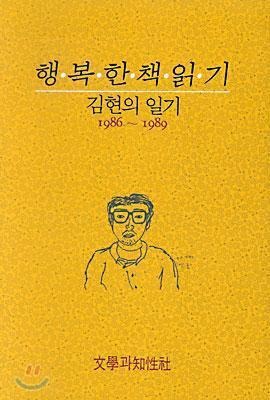티스토리 뷰
부제 "희귀 원고 도난 사건"
존 그리샴 장편소설, 남명성 옮김
소설은 첫 대목부터 눈길을 끈다.
"범인은 포틀랜드 주립 대학에서 미국 문학과 교수로 실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곧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예정인 네빌 맨친의 이름을 빌렸다. 완벽하게 위조한 대학 서류 양식에 쓴 편지에서 '맨친 교수'는 자신이 F. 스콧 피츠제럴드를 연구하는 젊은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동부 지역에 다녀가는 동안 어떻게든 그 위대한 작가의 '친필 원고 및 관련 서류'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편지는 프린스턴 대학 파이어스톤 도서관의 원고 소장부 책임자 제프리 브라운 박사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8p)
초반부는 전직 CIA 요원이었던 데니와 그 일당(총 5명)의 피츠제럴드 다섯 작품의 초고 도난 과정이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상당히 긴박하게 전개된다. 그치만 일당 한 명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초반에 FBI에게 쫓기고 만다. 여기까지는 흔한 범죄수사물 같은 분기기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두 장(챕터)의 장면은 이 작품의 남녀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브루스 케이블과 머서 만의 등장으로 갑자기 반전된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플로리다 키웨스트 카미노아일랜드란 곳에 '베이 북스-신간 및 희귀본 서점'을 오픈하여 성공한 브루스의 일화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시간강사로 문학을 가르치다 해고된 잊혀진 소설가인 머서의 신산한 삶이 대비되어 그려진다.
"그러나 그녀는 교수가 아니라 작가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의실에서 3년을 보내고 나니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설이나 짧은 이야기를 쓰면서 유유자적하는 자유가 애타게 그리웠다."
(103p)
여기서 보험관련(도난품 회수 및 협상 등) 특수한 일을 하는 일레인이 머서에게 접근하면서 이야기는 극적으로 전개된다. 이후는 머서가 그녀의 할머니 고향이기도 한 카미노 아일랜드의 오두막에 머무르며 브루스와의 의도적 관계를 맺고 그 주변인물들 - 주로 브루스 주변의 작가들과 브루스의 아내이자 동업자인 노엘 - 과의 소소한 일상이 중첩되면서 이야기는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흘러간다. 여기서 특히 마이라와 리라는 두 여성이 양념과 같은 티키타카 역할을 하는데, 이른바 통속소설가로 성공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그녀과 어울리는 같은 동네 작가들을 통해 글쓰기와 문학이란 무엇인가 - 창작과 경제활동 사이 어디쯤 - 란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베스터셀러 작가인 저자 존 그리샴이 그들을 통해 지난 그의 작품활동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마이라 집에서의 작가들 모임의 모습은 개인적으론 이 소설 전체 중 가장 유쾌하고 활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창작과 출판세태를 꼬집기도 하면서 가감없는 그들만의 세계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대목에서 저자의 팬서비스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줄거리가 후졌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그렇고. 솔직히 나도 좋다고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언제든 직접 출판할 수 있잖아요. 브루스가 서점 안쪽에 있는접이식 테이블에 다른 책들과 함께 진열해 줄 텐데."
브루스가 대답했다. "제발 참아 주세요. 자비 출판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요."(187p)
소설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차편집 같이 절도범 데니 일당이 다시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물론 여기서 머서와 브루스 간의 의도된 '썸'도 첩보 로맨스물처럼 전개된다. 법적 구속력 있는 혼인관계를 하지 않고 10년째 동거중이면서 각자 또 자유연애를 하는 브루스와 노엘 커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계약결혼'으로 유명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커플의 오마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머서와 브루스의 침실에서의 이야기 중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간의 픽션과 넌픽션을 오가는 일화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었다.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을 정도였다.
머서와 브루스가 도난품을 두고 밀당을 한 결과는 - 스포일러가 될듯 하여 궁금하면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듯 함 - 예상을 뒤엎게 되고, 에필로그에선 두 사람 모두에게 뭔가 여운을 남기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다. 간만에 재미있으면서도 서점과 출판계, 그리고 작가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물론 책을 좋아하는 면에서 브루스란 인물이 왠지 빌런 같지 않은 빌런 같고 또 남 같지 않기도 하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오랜만에 다시 소환한 것도 좋았고, 존 그리샴의 소설 역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내겐 3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오르게 하는 반가운 작품, 작가이기 때문이다. 존 그리샴은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니까, 아마 그때 출간된 그의 작품들 중 초판본 1쇄 책을 몇 권이라도 갖고 있다면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 이 서평은 출판사 도서제공을 통해 작성되었다.